산속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한번 누우면 영원히 자리가 고정된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 그 곳은 당연히 전망이 좋으며 주변이 푸근하게 싸여 외풍을 막아주어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철 푸른 소나무들이 우거져서 산새도 때때로 와서 벗이 되어 놀아주고, 맑은 샘물이 가까이 흘러 갈증을 풀어주는 곳이라면, 아마 이상적인 곳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것이 비록 티끌의 무덤일지라도...
내청룡이 팔에 걸릴듯이 나직히 가까이 있고, 우백호는 현무인 화령산에서 갈라져 깊숙이 용트림하면서 발치 앞에 멎어있다. 계하의 너럭바위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올라 졸졸졸 흐름을 시작한다. 건너편에서는 안산이 노송사이로 단정한 모습을 보인다. 좌포우회한 이 명당을 노송 여러 그루가 골짜기 입구를 지키고 있다.
여기가 바로 이 마을 예천임씨 금양파 입향조 야은 임억숙공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온 산천이 참꽃으로 붉게 물드는 이른 봄철이면 해마다 여기에서 후손들이 화전과 봄철에 어울리는 제물을 드린다. 이른바 春奠(춘전)이다
. 화전은 참꽃이 한참 필 즈음에 꽃잎을 따서 전을 부친 것이다.
마치 머리에 쓰는 갓처럼 생긴 솥뚜껑을 뒤집어서 걸어놓고, 기름을 두른 다음 반죽한 찹쌀가루를 넓적하게 펴고, 그 위에 꽃잎을 넣고 지진 것이 화전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화전놀이란 풍속이살아 있었던 것인데,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鼎冠?石小溪邊 白湖 林悌 白粉淸油炙杜鵑 雙箸挾來香滿口 一年春色腹中傳 작은 개울가에, 돌 괴어 쟁개미 걸고 흰가루 맑은 기름으로 참꽃전을 지진다. 젓가락에 집어오니 향기가 입 안 가득 한해 봄빛을 뱃속에 전하네. 눈 서리치는 동토의 겨울을 보내고 삼라만상이 환희와 희망에 들뜨는 계절에 참꽃 지짐을 부쳐서 먹고 노는 화전놀이는 거의 사라졌지만 조상께 바치던 유풍만은 아직도 남아 예와 이제를 잇고 있다. 문화도 적자생존이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멸하지만 복고풍도 또한 있으니,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화전이 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은공은 생전에 아주 불우한 분이었다. 자신이 4대독자로 태어나 사고무친한 혈혈단신으로 더할 나위없이 외로운 설음을 겪으며 살았다. 득남을 염원했으나 복의 한계인지 아들 조차 외아들이었다. 출생한 아들에게 자신의 염원을 담아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자손이 이어이어 태어나라는 뜻으로 이름을 枝生으로 지었다. 애달픈 하소가 하늘에 닿았을까? 손자가 둘이 태어났다. 이후에 증손은 삼형제 현손이하는 갑자기 급팽창하여 주위의 부러움과 위기감을 느끼기에 족할 정도였다. 자손이 많으면 壽?(수요)가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청년의 죽음이 이어지자 연화봉에 산소를 모셔서(야은공의 손자) 천지의 수기가 작용한 것이니, 天池를 붕괴시키라고 일러준 풍수도 아마 시기심과 위기의식이 다분히 작용한 소치였을 것이다.
야은공은 60세에 가난하고 외로운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직한다. 온 산야가 두터운 눈으로 슬픔을 조상하는 겨울날에 외로운 아들은 시신을 지게에 지고 가는 일꾼의 뒤를 따르며 하얀 눈만이 보이는 가까운 산골로 지향 없이 걸어갔다. 막막한 처지에서 한줄기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니, 인기척에 놀란 노루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난 것이다. 빠끔하게 터진 자리에 천광을 하고 안장하니 여기가 바로 소위 명당터인 것이다.
이 어찌 롯도복권과 같은 우연의 소치이겠는가? 福緣善慶임이 분명하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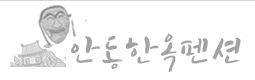

 오늘 : 92
오늘 : 92
